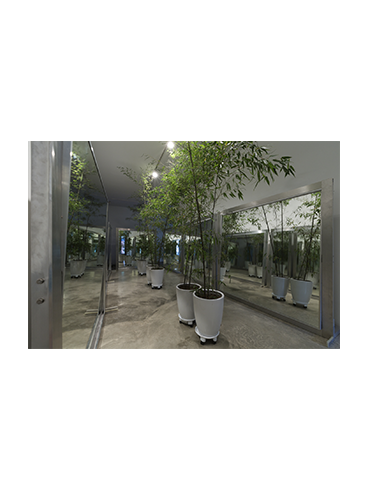이용백의 이야기는 일종의 화두와 같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그 근원으로 끊임없이 참구하다 보면 어느새 그 실체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초심자는 종종 그의 이야기를 표면적인(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념) 문제로 읽어냄으로써 그가 건네고자 하는 본질과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
3개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한 작업들은 마치 재료와 형태, 그리고 주제에 있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건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작업들은 이전의 작업들을 통해 제기해 온 실존적인 현상들에 대해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현상들의 이면을 하나하나 파고들어 가다 보면 이 작업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대한 저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이번 전시의 작업들은 '순간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이쿠의 시와도 같이 이용백의 그간의 작업들을 하나로 꿰뚫어 보고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게 하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금 묻는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고, 인문학과 과학을 분리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감성은 온전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정신은 온전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