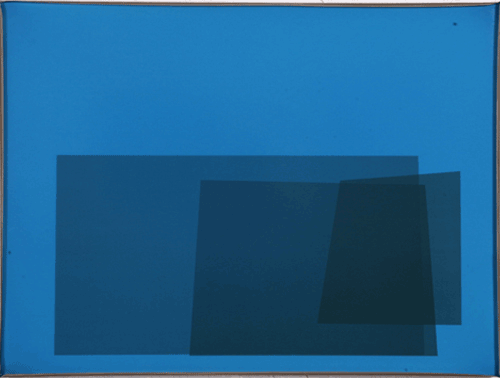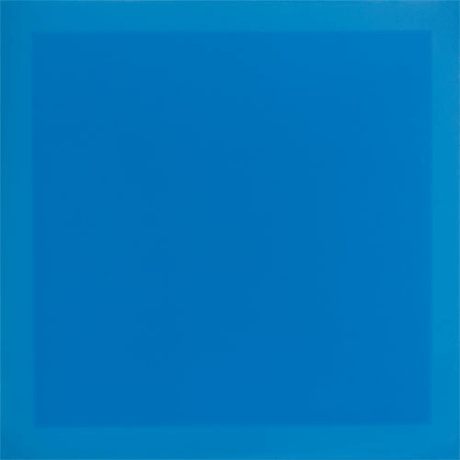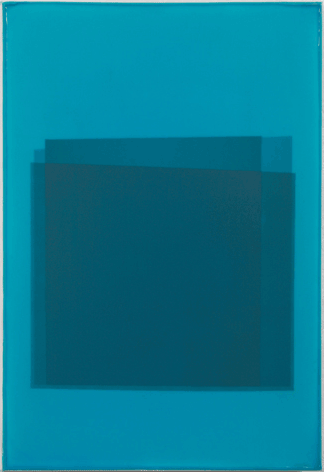천겹의 고원
이효성
<천겹의 고원> - 이효성의 모노크롬 세계 10년 이상 파리에 머물면서 작업 활동을 해 온 이 효성의 작품 세계는 초기의 앙포르멜적 추상에서도 이미 감지되듯, 모노크롬 회화를 줄곧 고수해온 그동안의 작품 과정은 모노크롬이라는 한 쟝르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동시에, 그 속의 다양성 또한 추구해 온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주로 표면과 깊이와의 관계, 그리고 마티에르라는 물질성과 비물질로서의 회화적 감수성과의 관계라는 추상 회화의 여러 문제들에 깊이 천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통 회화의 죽음으로서 서구 모더니즘 미술의 종착역으로서 일컬어지는 모노크롬 회화는 말레비치, 로드첸코로 대표되는 초기의 미학적, 유물론적 모노크롬이라는 두 갈래에서 파생, 이후 60년대 미국의 미니멀 아트에서의 거대한 색면 회화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이론, 프리드식 사물성(objecthood)으로서의 회화와 조각 사이의 오브제 개념, 그리고 유럽의 이브 클랭등에 의한 좀 더 정신적이고 신비스러운 비물질로서의 회화라는 양극의 개념에 동시에 위치하게 된다. 이의 70년대 한국에서의 수용이 서구와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물성으로서의 정신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단색파가 한국적 정체성과 연결되며 오래 지속해 온 것을 볼 때, 모노크롬 회화의 중요성은 사실상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효성의 작품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모노크롬 회화의 포스트 모던적 다양성으로서의 시간성과 사물과의 관계, 사이 공간과 흔적, 그리고 회화의 지층으로서의 역사를 단번에 집약시킨 천겹의 고원(plateau)이라는 지평을 구축함으로써, 그 어떤 건축적 장소(non-lieu)를 제시한다. 천겹의 피부(peau) 이 효성의 작품은 그 작업 과정이 이미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이는 프레임이라는 제한된 공간속에서의 재현의 부정에 의한 모노크롬이 아니라, 아예 프레임이라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조각적 프로세스가 작품 그 자체가 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그린다 라는 화가의 직접적인 손적 제스츄어가 아니라, 안료를 균등하게 붓고, 이를 말리고, 다시 이를 반복하는 비개성적 공정 과정, 즉 표피(surface)를 반복해서 덮음으로써, 끊임없이 또 다른 표피를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지층적 작업을 통해 독특한 “지형학적 추상“(abstraction topologique)으로서의 “장소”(non-lieu)를 제공한다. 이는 들뢰즈가 말한 또 다른 추상성, 즉 배제, 거부로서의 부정의 의미라는 모더니즘적 결과물로서의 추상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함축된 생산으로서의 포스트 모던적 추상의 또 다른 의미를 상기시킨다. 즉 환영과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자기 반영성(auto-réflexivité)만으로서의 추상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의 혼성을 통해 거꾸로 환영이 물질속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질속에서 형상 이전(pré-figure)의 잠재태로서 존재하는 질료로서의 추상의 가능성, 즉 또 다른 형상을 배태하고 부유하는 어떤 상태(etat)를 제시(présentation)함으로서의 현전(présence)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 이다. 이렇듯 이젤을 버림으로서, 시각적 지평에서 촉각적 바탕에로 전환된 천겹의 고원으로서의 이 효성의 모노크롬은 회화에서의 신체를 재현(re-présentation)하는 대신에, 아예 몸(corps) 그 자체로서의 피부(peau)를 사물화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효성의 모노크롬은 이렇듯 프리드식 사물성으로의 오브제에 단순히 그치지 않고, 비물질적 회화적 감수성이라는 추상적 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추상적 체험이란 존재의 묘사가 아닌 존재의 현시에 의한 숭고의 체험을 의미할 것 이며, 이는 물질이라는 재료의 현시가 대상의 설명이 아니라 대상의 초월이라는 비물질적 실체화에 이르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은 표면과 빛(lumière)과의 관계에 의해 더욱 더 그 추상성이 증폭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물론 지오토 이후 클랭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성과 절대성, 무한(infini)의 심볼로 여겨진 푸른색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더욱 더 심화된다고 보여진다. 이 효성의 작업에서 물질의 여러켜들을 가로지르며 진동하는 빛의 변이 효과는 마치 해양적 배경속의 액체적 지각으로서의 촉각적인 마티에르라는 물질성이 비물질이라는 추상적 체험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작용하며, 이는 이러한 안료의 잠재적 실험을 추구하는 그의 작품에서 비물질적 초월성에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번 전시에서 새로이 시도되는 회색 모노크롬 시리즈는 마치 공간에서 그 본질인 공백을 다루듯, 아예 색채 또한 본질 그 자체를 함께 다루게 된다. 이러한 추상적 색채는 본질로서의 텅 빈 추상적 공간과 함께 “부재로서의 드러남”(presence de l'abscence)이라는 장소를 제시한다. 사이 공간(entre espaces)과 흔적(traces) 이 효성 회화에서의 이처럼 켭켭이 쌓여진 층들을 관통하는 빛에 의한 효과는 회화의 표면/깊이, 그리고 바탕의 투명/반투명이라는 관계를 넘나들며 애매모호한 유희를 한다, 이는 구상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일류젼으로서의 퍼스팩티비티가 아니라, 빛에 의해 창조되는 물질 내부속에서의 공간이라는 또 다른 공간적 거리감을 창출해낸다. 즉 환영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현존으로서의 물질 내부 사이의 차이 공간을 드러낸다는 것 이다. 이러한 깊이의 효과는 지층들의 얇은 켜들 사이에 숨겨져 사라지듯이 드러내는 나타남/사라짐(apparition/disparition)으로서의 유희에 의한 미묘한 흔적들로 더욱 더 심화된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건이 지나가고 있음을, 무형태로서의 비결정적 실루엣으로 드러낸다. 마치 어떤 몸짓들의 흔적처럼 각인되어, 심연에서 표면으로 솟아오르고자 하는 어떤 사건들의 기다림과 유사하다. 이렇듯 마치 고고학적 지층속에 화석화된 시간들의 켜로 형성된 장소로서의 이 효성의 모노크롬은 사물로서의 오브제이자 동시에 초월적 공간으로서 회화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내부적 그 어떤 장소를 구축한다.
김 수현 주불 문화원 큐레이터